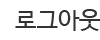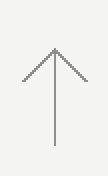-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1956년 1대 임인식은 남산에 올라
81척 이승만 동상 기념식 사진 찍어
서울 환도 3년 만…“당시 권력층 정서”
4·19 때 시민들이 동상 끌어내 부숴
외국인들에게 전시하고 싶어 지은
외인아파트 94년 해체 현장에
2대 임정의 연속 촬영 “한심했다”
동상·아파트 사라진 남산 아래서
3대 임준영, 해방촌 골목길 풍경 포착
3대 임준영, 해방촌 골목길 풍경 포착

1956년 8월15일 1대 임인식 작가가 촬영한 남산. 이승만 대통령 동상 제막식 현장이다. 하늘에서 경비행기가 축하비행을 하고 있다.
태풍 ‘솔릭’ 예보가 있던 날 오후 5시, 건축사진가 임준영(42)은 장비를 들고 서울 을지로에서 남산 가는 버스에 올랐다. “태풍 몰아치기 전에 예스러운 풍경을 찾고 싶었어요. 산자락 타고 내려가 용산동2가 해방촌으로 들어섰더니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건축 사진 작업은 늘 발품과 인내로 시작한다. 산마을을 돌고 골목을 훑었다. 해방촌 특유의 오랜 집채들과 반짝 빛이 오른 서울N타워(남산타워)가 음악처럼 어우러진 장면이 보였다. 삼각대를 폈다. 1955년, 1대 사진가 청암 임인식(1920~1998)이 이곳에 오른 뒤 62년 만이었다.
‘국부 탄신’을 축하했던 81척 거대 동상
1956년 8월15일. 남산 상공에서 경비행기가 재주를 부렸다. ‘쿵짝쿵짝’ 군악대가 흥을 돋웠다. ‘이승만 동상 건립 준공식’이 한창이었다. 해발 265m 남산 중턱에 축대까지 합쳐 81척(약 25m) 높이 거대 동상이 들어섰는데, 지척에 서울 시민들도 잘 몰랐다. 2대 사진가 임정의(73)의 말이다.
“아버지가 당시 대한사진통신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니, 집 안에 그날 사진이 남은 거예요. 큰 행사였어요. 훗날 1960년 4·19혁명이 났을 때 시민들이 우르르 올라와서 동상을 밧줄로 끌어내렸다니까요. 괭이와 망치 등으로 부숴버린 사건이었죠.”
서울 사람들은 대대로 야트막한 남산에 정을 주며 살아왔다. 600년 도읍, 한양을 감싸는 성곽이 지나갈 때부터 남산은 한양도성 순성길 가운데서도 인기 구간이었다. 일제강점기를 버티고 해방과 전쟁을 겪은 뒤에는 피난민들이 몰려 대규모 판자촌인 해방촌을 이루고 있었다.
이승만 동상 건립은 1953년, ‘서울 환도’ 고작 3년 뒤 벌어진 일이다. 임정의가 덧붙였다. “당대 권력층 정서가 그랬어요. 자연보호 등 인식은 갖기 힘들었고, 돈이나 벌고 지도자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승만을 ‘국부’라 이르던 시절이었다.
임정의가 공들여 찾은 필름을 들어올렸다. 차르륵 펼쳐진 프레임 속에 동상이 가득했다. 동상은 1955년 ‘이승만 대통령 80회 탄신 축하위원회’ 발의로 이듬해 완공했다. 국회 정식 의결 사안으로 국회의장 이기붕이 동상건립위원장을 맡았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동상을 우러르며 서로 질세라 박수를 쳐댔다. 동상 건립에 총 2억656만환이 들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5달러(약 7만5천원)인 해였다.
‘치적의 시대’와 남산 외인아파트 폭파

1994년 11월20일 2대 임정의 작가가 촬영한 남산 외인아파트 폭파 모습. 10장의 연작 중 네번째 사진이다.
전후 제1공화국의 발자국을 기록한 1대 사진가 임인식이 있었다면, 2대 임정의는 자연스레 3·4공화국의 개발시대 기록을 이어나갔다. 건축사진가로 성장한 임정의는 5·16 군사쿠데타 후 포클레인(삽차) 소음이 한창이던 남산 중턱을 자주 들락거렸다고 한다.
“60년대 젊은이들도 지금처럼 남산 성곽길 따라 데이트를 많이들 했거든요. 남산 자체가 참 아름다웠어요. 케이블카와 남산타워가 잇따라 준공돼 사람도 좀 늘었죠. 저도 남산 성곽길 따라 걸어올라가 사진을 남기곤 했어요.” 훗날 임정의가 만나 일을 같이한 건축가 김수근이 남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건축 설계 현상공모 당선작 중 하나로 데뷔한 시점이었다. 시공 계획은 철회됐지만, 빈자리를 기다린 듯 다른 건축물들이 재빨리 들어섰다.
“군사정부가 그 자리에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을 세운다고 기둥 올리던 때예요. 70년대 당대 최고 높이였던 남산 외인아파트, 하얏트호텔도 세웠고요. 사실 이게 전시용에 가까웠어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남산 남측 한남동이잖아요? 외국인들에게 보이겠다고 지은 게 그 외인아파트예요.” 임정의가 계속 말을 잇는다.
“1994년 외인아파트 폭파할 때도 제가 현장에 있었죠. 문민정부 들어 남산 경관 살린다고 ‘남산 가꾸기’ 사업할 때인데, 11월20일 오후 3시 폭파한다고 해서 단국대역으로 달려가 연속촬영했어요. 두 개 동이 ‘펑’하면서 눈앞에서 하나씩 무너지는데, 지켜보며 참 한심했던 기억이 나요.” 뒤섞인 10장의 연작 사진. 느긋이 순서를 맞추는 그다. “건축물은 그 이면을 볼 때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이권과 치적이 얽혀서 말이에요.”
동상과 아파트 자리에 들어선 신명분

2018년 8월22일 3대 임준영 작가가 촬영한 남산 해방촌. 예술사진에 무게를 두는 작가가 뉴욕, 런던, 파리 등 주로 대도시 작업으로 선보이고 있는 'Like Water' 테마의 31번째 작품이다. (@juneyoung_lim)
오늘날 남산 해방촌. 해방 전후 각박한 삶들이 갈 곳 없어 흘러들었던 동네는 세월이 흘러 정겨운 동네로 이름났다. 남산타워를 등대 삼아 좁은 길을 누빈 3대 사진가 임준영은 ‘옛 골목 정취가 있는’ 동네에서 소위 말하는 ‘뜨는 동네들’의 기시감부터 전했다.
“어르신들 왔다 갔다 다니시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골목 속에 ‘상권’이 부쩍 밀고들어오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이런 일에 늘 장단점이 있잖아요. 동네가 갑자기 불붙어 뜨거워지면, 열기가 식은 후 이 공간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삶에 해를 입는, 그런 과정들 말이죠.”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다. “건물 임대료가 올라가면 원주민과 예술가는 집을 떠나고, 대기업이 동네를 장악하는 순서. 남산 자락에도 그런 조짐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도시재생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이 마을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서울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는가. 임준영의 입에서 몇 개의 동네 이름이 줄줄이 나열됐다.
“원래 태풍 직전에 날씨가 맑아 촬영하기 좋아요.” 임준영은 앞서 “건축 사진은 건물의 표정을 담는 동시에 주변 관계를 담기 때문에, 시대 기록물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말한 적 있다. 동상과 아파트가 사라진 빈자리, 젠트리피케이션 풍경이 들어선 고요한 골목이야말로 폭풍 전야 같았다.
기획·글 전현주 객원기자 fingerwhale@gmail.com
사진 청암사진연구소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서울& 인기기사
-
1.
-
2.
-
3.
-
4.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