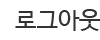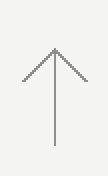-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오늘 7월부터 서울의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들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던 폐비닐을 폐비닐 전용봉투나 일반 비닐봉지에 따로 모아 배출하면 된다. 그림에 표시된 폐비닐이 그 대상이다.
작은 실마리가 하나둘 풀리면 결국 큰 매듭이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이유는 플라스틱 문제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거대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다양하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 때문에 각종 포장재부터 의류, 가구류, 차량 등에 쓰이며 우리 일상을 지배해왔다. 석유화학으로 만들었는가, 분해 가능한가, 한 번 쓰고 버리는가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뉘는데,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수명이 짧은 석유화학 소재 플라스틱이다. 고작 70년 남짓한 역사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다. 플라스틱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총량이 무려 83억t인데, 미국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2만5천 개를 합한 무게에 해당한다. 서울시민 1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 속 플라스틱은 지난 10년 사이 3.9배, 즉 약 4배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전체 생활폐기물은 1.4배 늘었다. 양도 양이지만 지금처럼 관리하면 시민들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이나 종량제봉투 속 플라스틱 모두 처리 과정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 페트병, 세제통 등 딱딱한 플라스틱 용기와 달리 작고 가볍고 모양이 일정치 않은 비닐류는 선별장에서 재활용 처리를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서울시민들은 보통 플라스틱 중 작은 비닐류 포장지, 식품 포장, 검정 비닐봉지 등을 종량제봉투에 버리는데, 2018년 수도권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 이후 다양한 매체에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도록 알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종량제봉투에 담겨 소각될 경우 다른 일반쓰레기에 비해 2배 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이 되고, 나날이 늘어가는 플라스틱양은 안 그래도 부족한 서울시 처리용량에 큰 부담이 된다. 양은 많고 종류는 복잡한데 재활용과 비재활용 어느 곳에서도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플라스틱 문제를 상징하는 골칫덩이가 바로 비닐류 폐플라스틱이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은 지속가능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서울시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는 ‘비닐은 비닐끼리 따로 모아 재활용’이라는 목표 아래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2018년 폐비닐 수거 대란 이후 종량제봉투 배출을 유도해왔으나 기술과 산업 발전, 공공처리시설 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재활용 대안을 시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맞게 분리배출 요령도 개선했다. 커피믹스 봉지, 양파망, 보온보랭팩, 비닐·플라스틱노끈 등을 폐비닐 전용봉투에 따로 담아 배출하면 된다. 내용물을 톡톡 터는 정도로만 제거하면 된다고 하니 물로 헹구고 정리하는 불편도 덜 수 있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비닐 포장재 배출이 많은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따로 모은 비닐은 또 다른 플라스틱 용기로 재활용하거나 열분해를 통해 석유 원료로 다시 자원화한다. 잘 버리고 그걸 모아 새로운 재활용 시장을 만들면 돈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시민은 버리기만 하고 치우는 건 자치단체의 역할로 치부돼왔다면, 이번 사업을 통해 폐비닐을 자원화해 이윤을 남기는 기업의 역할이 생겨난 것이다. 치워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다시 쓰는 자원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럼에도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 찬성했고, 무엇보다 생산단계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기업, 소상공인, 시민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등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환경부, 산업자원부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할 때다.

서울& 인기기사
-
1.
-
2.
-
3.
-
4.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