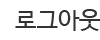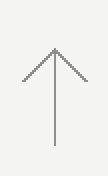1930년대 말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한옥이 빼곡하게 찬 돈암동·보문동에 친가를 둔 사회활동가 김명신씨가 이모 정정옥(86)씨를 모시고 왔다. 이 동네 삶과 역사를 연륜의 차이만큼 더 많이 알기 때문이다. 김씨의 친가는 비교적 규모가 큰 한옥이다. 이모 정씨는 김씨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자랄 때에도 함께 살았다. 이모 정씨는 최근 시선 집중을 받는 서울의 또다른 한옥마을 종로구 익선동에서 태어나 12살 때인 1941년 보문동으로 이사왔다. 그때 처음 전차를 탔고 신설동역에서 내려 걸어왔다고 했다. 돈암동에 전차 종점이 생기기(1941년 7월21일) 전의 일이다.
“이사 오니까 초가집이 많았어. 우리 집도 초가집이었어. 그때 아부지가 형편이 안 좋았거든. 이사 오는데 전차에서 엄마가 자꾸 우시더라구.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엄마, 저 나무가 가’ 그랬어.”
이 이야기는 일제가 경성부(서울시) 확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중에도 이 지역은 삼선평으로, 농촌 지역이었고 초가 마을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피난살이 10년 만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새 집을 짓고 있었어. 그게 이 집이야.”
이모 정씨의 말은 김씨 친가인 근대 한옥이 지어진 해가 1960년이라는 증언이기도 하다. 근 60년이 된 집이지만 아직 깨끗한데, 당시만 해도 자재가 좋고 목수 솜씨도 좋았던 탓이다.
집이 지어질 즈음 김씨는 대여섯살이어서 엄마 손에 이끌려 다니던 보문시장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보문시장은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된 노릇일까?


골목은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 골목을 오가며 만나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공동체를 만들어간다. 사람이 몰리니 점포가 생기고 주점도 생긴다. 어떤 골목에서는 다듬이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재봉틀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것들이 상품이 되면서 자연스레 시장이 됐을 터였다.
창호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다듬이소리는 정갈한 한국 여인들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재봉틀 소리는 성실한 골목 사람들을 상상하게 한다. 게다가 아이들은 골목 안에서 자란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놀며 다투기도 하고 편짜기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율과 규칙을 만들기도 한다. 실핏줄처럼 가느다란 골목이 살아 있는 돈암동 보문동 한옥마을에서 사람들은 더 행복할 수 있다.
글·사진 김란기 '살맛나는 골목세상'탐사단 운영, 문화유산연대 대표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