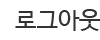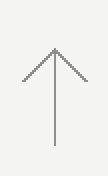또 제기동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의 집도 있었다. 그도 역시 60년대에 제기동 151번지 집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삶을 마감했다. 찾아볼 집도 많다. 홍릉 부흥주택이라 하는 곳이 있는데, 부흥주택이 뭘까? 원조주택, 희망주택, 후생주택, 재건주택도 있었다는데 그런 종류일까? 부흥이라는 말에서 그렇지 못한 세월의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부흥주택 골목에서 오히려 천진한 모습들이 살아 생동하는 것을 보게 되니 역설적이다.
홍릉 부흥주택은 지금껏 사람들의 입으로만 전하던 이름이고, 행정적으로는 청량리동에 속하지만 기실 제기동이라 할 만한 위치에 자리 잡은 원조주택이다. 이런 부흥주택이 고스란히 남아, 크게 윤택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인정과 정겨움이 고스란히 드러난 채 그 역사를 전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1955년에 시영주택으로 204채를 지었고, 대한주택영단은 1957년에 283채를 지었다. 말하자면 행정(1958년 택지 조성)보다 현장이 앞서가는 시대의 이야기가 된다. 어떻게 이처럼 큰 단지가 줄을 잘 맞춰 흐트러지지 않는 채로 여직 남아 있을까? 그러면서 각각의 집들은 그간 나름의 삶의 지혜를 살려 조금씩 고치기도 하고 늘리기도 했다. 2층 난간뜰은 대부분 확장해 실내 공간으로 쓰지만 더러는 파릇한 꽃나무로 꾸미기도 했고 빨래를 너는 곳으로 쓰기도 한다.
1950년대 중반부터 지었다고 하니 그 건축 기술이나 주거 형식은 대략 짐작할 만은 하다. 바위를 깬 돌가루와 석회를 섞어 만든 벽돌로 지었으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일이다. 한 가구가 1, 2층을 쓰는 복층 주거이며 4가구를 한 동으로 해 일직선으로 늘어선 단지는, 하나는 1동 단열이고 다른 하나는 2동 병렬형이다. 병렬형의 주택들은 서로 등을 맞대며 좁디좁은 골목을 만들어 내어 따스한 온정을 나누는 듯하다.

그나저나 이 동네에는 왜 이렇게 자전거가 많을까? 좁은 골목이든 좀 더 넓은 골목이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여기저기 서 있고 타고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아무래도 넓은 단지 안에 버스가 들어오지 않고 인근의 청량리 시장이 적당히 가까워서이리라!

홍릉 부흥주택이 들어서기 전의 이 일대 땅은 본래 창덕궁 소유 대지였다. 말하자면 조선 왕조 소유였던 셈이다. 일제하에서는 이른바 이왕가 소유의 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일제는 1940년 조선총독부 고시로 이곳을 청량공원으로 지정했고 이듬해에는 ‘조선시가지계획령’에 근거해 풍치지구로 지정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되는데 임업 관련 시설은 가능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산림연구원(옛 임업시험장)이 후에 들어서기도 했고, 또 일부는 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들어서기도 했다. 이런 땅의 일부(서쪽)를 해방 뒤에 해제해 주택단지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던 홍릉 부흥주택단지가 이제는 ‘청량리 6주택재개발’이란 이름으로 사라질 것이라 한다.

골목에서 만난 이수영(63) 씨는 “일제 때에는 근처에 관사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관사에서 태어났어요. 2층 다다미방이요”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부흥주택지가 일제 시기에 관사? 아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옛 성동역(지금의 지하철 제기역) 앞이라 했다. “그때 성동역은 경춘선 출발역이었어요. 성동역 없어지고 성북역으로 갔다가 다시 청량리역으로 갔지요. 성동역 앞에 강원도에서 싣고 온 원목 적재장도 있었고요, 비단잉어 키우는 ‘금붕어칸’도 있었어요.”
찾아볼 옛 흔적도 많고 입으로 전해내려 오는 소소한 이야기도 많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리영희 선생은 제기동에 살면서 양계를 하려 했다는데, 사실일까? 소설가 염상섭이 부암동에서 양계를 하며 살았다며 자신도 그렇게 해 볼 심산이었다는데 실현을 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1969년 <조선일보>에서 해직되자 어머니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면서 육체노동의 방안을 찾던 중 양계를 생각해 냈으나,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생각을 접고 택시 운전을 했다고 하는 그의 집은 홍릉 부흥주택 인근 제기동의 13평 한옥이었다.
글 김란기 ‘살맛나는 골목세상’ 탐사단 운영, 문화유산연대 대표
사진 김란기, 리영희재단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