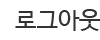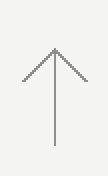삼청동, 팔판동, 안국동, 소격동, 화동, 사간동, 송현동을 아울러 삼청동이라 한다. 앞의 7개 동은 법정동이고 그것을 아우른 삼청동은 행정동이다.
삼청동(법정동) 면적의 반 이상이 북악산이다. 사람이 사는 마을은 삼청동 남쪽에 있다. 삼청동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이 북악산 기슭에 있는 서삼청동이다. 그 마을 초입에 종로11 마을버스 종점(정류장 이름은 ‘삼청공원’)이 있다.
종로11 마을버스 종점 서쪽이 서삼청동이고 동쪽이 동삼청동이다. 서삼청동과 동삼청동의 공식 이름은 각각 삼청서부동과 삼청동부동이지만, 예로부터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서삼청동, 동삼청동이라 했다.
서삼청동에 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는 샘이 하나 있다. 조선 시대 정조 임금 때 이 마을 샘물을 임금에게 진상했다고 한다. 10여 년 전까지도 이 샘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있었다. 수질 검사에서 마실 수 없는 물로 밝혀진 이후로 샘을 찾던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샘물만 넘쳐흐를 뿐이다.


삼청동의 ‘삼청’은 도교의 ‘삼청전’인 태청, 상청, 옥청이 있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삼청’이란 이상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산과 물이 맑고 인심도 산과 물을 닮아 좋다고 해서 ‘삼청’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조선 시대 임금에게 진상됐던 샘물과 궁중 전용 우물이 있던 마을이니 물 맑은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지금도 북악산은 맑고 푸르다.

조선 시대 삼청동은 한양 최고의 숲과 계곡이었다. 하지만 주변에 화약과 무기를 다루고 보관하던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그 일대는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른바 ‘군사보호지역’ 정도 됐나 보다.
1619년 여름, 출입을 통제하는 삼청동 계곡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순찰하던 군사에게 발각됐지만 아이들은 훈방됐다. 1659년에는 사대부 집 여인들이 계곡으로 놀러 왔다가 단속에 걸렸다. 그들은 집안의 가장이 오고서야 풀려났다. 출입금지의 금표를 무시하고 찾고 싶은 곳이 삼청동의 숲과 계곡이었나 보다.
일제강점기에는 여름이면 ‘탁족회’, ‘복놀이’로 사람들이 삼청동 계곡을 찾았다. 계곡은 삼청동에 살던 여인들의 빨래터이기도 했다. 지금은 삼청공원 후문 부근에 옛 계곡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을 뿐이다.

삼청공원 후문 부근에 남아 있는 삼청계곡의 흔적을 돌아보고 도로를 따라 내려가면 종로11 마을버스 종점 마을인 서삼청동이 나온다. 서삼청동 초입에서 골목을 거슬러 올라간다. 점점 좁아지는 골목은 꽃 피고 새 우는 산과 만난다. 개나리꽃이 활짝 핀 돌계단을 올라가면 길은 끝나고 산이 시작된다. 그곳 바위에 한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다. 그곳에서 돌아나와 다른 골목으로 향했다.
구불거리는 골목은 여러 갈래인데 어떤 곳은 끝이 막혔고, 어떤 골목은 다른 골목과 이어지기도 하고 큰길로 연결되기도 한다. 카페, 음식점, 주택이 밀집된 삼청동 카페거리에서는 볼 수 없는, 옛 삼청동 골목이 남아 있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니다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나서 마을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마을에서 산 지 50년이 넘었다는 아주머니는 102살 할머니가 아직도 살아 계신다는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판잣집에 돌을 쌓고 거적 달아 몸 누일 집 한 칸 짓고 살던 세월이 있었다. 아줌마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 날라 집을 지었다. 지금이야 보기 좋게 집을 짓고 살고 있지만,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으며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40년 된 집, 30년 된 집, 이제 막 집을 옮겨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늘을 가린 큰 나무 한 그루가 바위화단에 피어난 분홍색 작은 꽃을 비호하듯 서 있다. 그 골목을 지나는 아주머니 한 분이 맑은 미소로 인사를 한다. 골목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글·사진 장태동 여행작가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