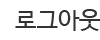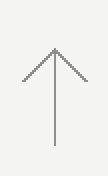1978년부터 석조 유물을 수집하던 한 사람의 뜻이 2000년 경기도 용인에 세중옛돌박물관의 문을 열면서 일반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중옛돌박물관은 2015년에 성북구 성북동 골짜기 언덕에 우리옛돌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북02 마을버스 종점 정류장 이름이 ‘우리옛돌박물관·정법사’다. 종점 정류장 바로 앞에 우리옛돌박물관이 있다.
1만8155여 ㎡(5500여평)에 자리 잡은 박물관은 실내외 전시장에 1000점이 넘는 석물과 자수, 근현대 한국회화를 전시했다. 실내 전시장은 1층 환수 유물관, 2층 동자관과 벅수관, 3층 기획전시관으로 나뉜다. 실외 전시장에서도 여러 종류의 우리 옛 돌을 볼 수 있다. 능묘와 관련된 옛 돌에는 문인석, 장군석, 석수(짐승 모양의 석물, 무덤을 지키라는 뜻으로 무덤 속이나 무덤 둘레에 둠), 향로석, 장명등(무덤 앞이나 절 안에 돌로 만들어 세우는 등), 망주석(무덤 앞에 세우는 돌기둥 한 쌍) 등이 있다. 민간신앙과 민속을 엿볼 수 있는 동자석(사내아이의 형상을 새겨서 무덤 앞에 세우는 돌), 벅수(장승), 민불(돌미륵), 석호상(왕릉이나 큰 무덤 주위에 돌로 만들어 세운 호랑이 상), 솟대 등도 있다. 관솔대(관솔불을 피우던 대)와 해시계, 측우기, 기우제단 등 생활과 관련된 옛 돌도 볼 수 있다.

2층에는 동자관과 벅수관이 있는데, 동자관으로 들어가는 어귀에 제주 동자상을 전시했다. 조선 후기에 제주도에서 만든 것이다.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비친다. 벅수관에 전시된 다양한 벅수 또한 그 표정이 다 다르다. 옛사람들은 마을 들머리나 길가에 사람의 얼굴을 한 벅수를 세워 역신이나 잡귀가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우리옛돌박물관 옆에 정법사가 있다. 정법사는 원래 복천암이었다. 조선 후기 호암 체정 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1959년 서울 가회동에 있던 건봉사 포교당인 정법원을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정법사라고 했다 한다. 작은 절 한쪽에 부처상이 보인다. 부처상 뒤로 올라가 부처상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았다. 세상을 향한 부처상의 손끝에 세상이 얹힌다. 절집 추녀에 매달린 풍경이 울린다. 작은 소리가 부처상이 바라보는 공중으로 퍼진다. 코끼리를 타고 있는 어린 부처상을 지나 작은 정원이 있는 곳에서 멀리 서울 도심의 귀퉁이가 보인다. 그곳을 바라보는 부처상의 시선이 따뜻하다.
해 질 녘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든다. 다른 나라 대사관 건물이 성벽처럼 자리잡고 있는 골목을 지나 성북02 마을버스가 오가는 길을 따라 내려가는 길에 이 마을 또 하나의 절, 길상사에 들렀다.

길상사는 1997년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 서울 분원으로 탄생했다. 1995년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말사 ‘대법사’로 등록했다가 1997년에 길상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길상사에는 길상화 김영한과 법정 스님의 일화가 내려온다. 길상사 자리는 원래 대원각이라는 음식점이 있었다. 약 2만3000㎡(약 7000평)의 땅에 40여채의 건물이 있던 큰 식당이었다. 김영한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을 알게 된 뒤에 이곳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기증하고 이곳에 절을 세워줄 것을 법정 스님에게 부탁했는데, 법정 스님은 그 부탁을 여러 차례 고사했다. 그러다 끝내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여 절을 세우게 된 것이다.
해거름 절 마당에 있는 300년 된 느티나무에 이 세상을 살다 간 사람들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등이 줄 맞춰 걸렸다. 성북구의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느티나무도 보인다. 길상7층보탑이 절 마당 한쪽에 서 있다. 안내글에 법정 스님과 길상화 김영한의 뜻을 기리기 위해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이 기증했다고 나온다.

글·사진 장태동여행작가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