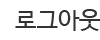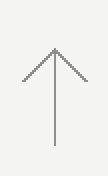일본군사령부~총독부~노기신사
경성신사~조선신궁 터로 이어진
5리 남짓한 치욕의 길

남산을 오를 때는 먼저 발을 디뎌야 하는 곳이 있다. 한국통감관저 터다. 왕조는 이곳에서 명줄이 끊겼다. 경술국치. 단군 이래로 국토의 운명이 몇번 바뀌기는 했지만 국권을 완전히 상실한 건 처음이었다. 1910년 8월22일 하오, 마치 부동산 거래라도 하듯 도장을 찍어 나라를 통째로 넘기면서 이 땅의 운명은 이방 족속의 소유물인 양 전락하였다. 근대 남산이 기억하고 있는 첫번째 쓰라린 상처다.
한국 총리대신(조선 말기의 최고위 관직)은 그날 일기(<일당기사>)를 남겼으되, 칙어(임금이 한 말이나 그것을 적은 포고문)를 받들어 전권위임장을 받아 곧장 통감부로 가서 데라우치 통감과 회견하여 일-한 합병조약에 상호 조인(서로 약속하여 만든 문서에 도장을 찍음)하고, 이 위임장을 궁내부에 환납했다고 짧게 기록하고 있다. 518년 왕조의 최후는 단 한줄로 간략했다. 어떤 소회도, 하물며 날씨조차도 남기지 않은 그의 이름은 우봉 이씨에 완전할 완, 쓸 용 이완용(李完用)이다. 그의 손끝에서 조선은 그의 이름처럼 마지막 숨결을 소진했다.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일본말을 잘하지 못하는 이완용을 위해 농상공부 대신 조중응이 국치 현장에 동행하기는 했으나, 평소에 이완용의 일본 관련 업무 등을 보필해온 이는 비서 이인직이었다. 신소설의 기원이라는 <혈의 누>의 작가 말이다. 이인직도 그날을 가늠하는 어떤 기록이나 회고를 끄적거린 흔적이 없다. 산천과 초목이 흘리던 피눈물(혈루)을 그는 정작 듣고 보지 못한 것일까?
다만 일제는 이곳을 기념공간(시정기념관)으로 만들고, 국치에 이르는 과정을 외교 행정적으로 조직화한 하야시 곤스케 동상까지 세웠다. 동상 건립 때 살아 있던 그가 방문해서 연설을 했다(1936년). 광복 뒤 청동 인물상은 사라졌고 받침돌 따위만 떠돌던 것을 긁어모았으니 ‘거꾸로 세운 동상’이다. 식민지 기억을 재구성한 이 조형물 앞에는 ‘남작하야시곤스케군상’이라는 명문(돌에 새겨놓은 글)을 뒤집어서 읽을 수 있도록 표면이 잘 닦인 오석(검은 돌)을 배치하고 ‘검은 거울’로 삼았다. 광복 70년에 마침 연출을 할 수 있는 구실이 주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제 침탈 뒤 오늘까지 흔히들 이 일대를 왜란을 당하던 해에 왜군이 진을 친 까닭에 ‘왜장대’ ‘왜장터’라 해왔다고 하는데, 일찍이 정조 때 <한경지략>은 말하고 있다. ‘남산 기슭 주자동에 봉우리가 닳아서 평평한 곳에 사사장(모래밭)이 있다. 곧 영문(감영, 조선 시대에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아)의 군졸들이 기예를 연습하던 곳으로 ‘예장’이다. 속칭 왜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이제라도 고쳐 기록할 일이다.
길은 여기서 시작된다. 국치 터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3·1운동 때 진압군이 쏟아져나오던 일본주차군사령부(남산한옥마을)이고 왼쪽으로 돌면 바로 총독부(애니메이션센터)다. 그곳과 담장 하나를 두고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 책임자였다가 죽은 뒤 군신으로 떠받들리는 군국주의 화신 노기 마레스케의 노기신사(남산원, 리라초)와 경성신사(숭의여자대)가 있다. 거기서 비탈을 타고 오르던 길은 이내 산등을 내려가면서 서쪽에서 온 길과 만나 올려다보면 까마득한 384계단 돌층계를 밟고 조선신궁(한양도성 복원 지점)으로 향한다. 한반도 전체에 있던 1000여개 신사를 호령하는 일제 국가신앙이 군림하던 자리다. 신궁 터에 산 사람의 동상이 한번 더 건립되었으니,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다. 제국주의 상징 조작의 기억 위에 올라탄 형국이었다. 동상은 4월혁명으로 쓰러졌다.

남산 허리를 휘감고 도는, 순환도로라고 하는 길은 애초에 신궁에 이르는 참배 도로였다. 국치 터에서 낸 길은 동참도, 숭례문에서 오도록 한 표참도(참궁신도로), 후암동 기슭을 타는 길은 서참도였다. 그 동참도의 자취 위에 새 길을 닦고 있다.
서울시가 올여름부터 공을 들여 내년 8월 ‘국치길’로 길을 연다. 길의 출발점인 국치 터 근처에는 남산의 내력과 길의 역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안내 장치를 설치한다. 살 한점 떼어주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던 고기 육(肉)자 ‘중정 6국’에 관한 흔적들 또한 알뜰히 모아서 ‘기억 6'으로 조성된다. 신궁 터 걸어서 오르는 길바닥에도 걸음걸음마다 표식을 심을 참이다. 빼앗긴 길에서 새 역사로 가는 길을 찾아내고자 하는 뜻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길은, 걷는 사람을 닮는다. 걸을수록 길은 날로 벼리어낼 수 있다. 여럿이 함께 걷는 길은 기어이 큰길을 만들어낸다. 대중의 기억이야말로 불패의 기억, 곧 역사다. 이방에서 들어온 이들에게 국치를 당할 무렵, 지천으로 핀 풀꽃에 ‘망(국)초’라고 이름을 붙인 이들은 한낱 초목 같은 이들이었다. 꽃이름으로라도 새겨 망국을 잊지 않고자 한 것이다. 8월은 광복이자 국치를 당한 달이다. 국치길은, 삼천리 어디든 망초꽃이 피는 그 사이로 나 있다.
서울시 국치길 기획자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