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했지만 나 자신 덜어내는 계기
만남과 모임의 과소비 줄여야
군더더기 줄이니 나에게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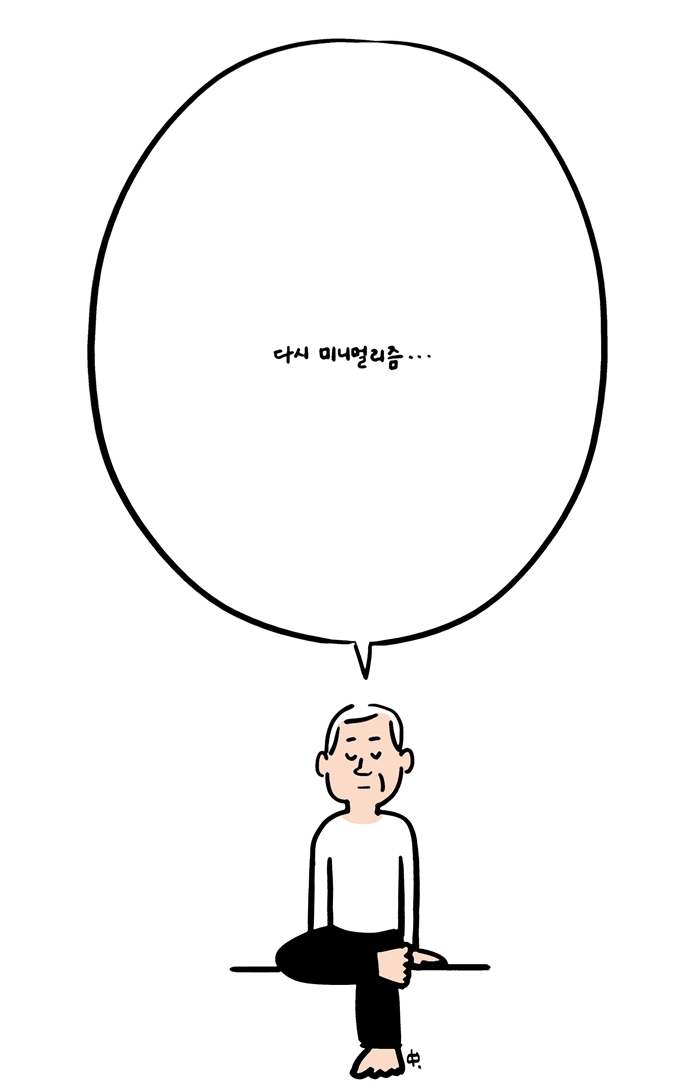
운전 도중 깜빡이도 켜지 않고 차선을 급변경해 들어오는 차를 만나면, 놀란 나머지 입에서 향기롭지 못한 말이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 해도 자제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도로 위에서 겪는 이런 무례한 상황은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서도 종종 겪는다. 며칠 전이다. 어느 모임에서 만난 사람은 느닷없이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요즘 너무 일 많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살살 하세요, 살살! 인생 뭐 있나요? 저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비웠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질문인지 충고인지 자신의 결심인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질투를 담은 공격인지, 도무지 그 의도조차 짐작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화성이나 달나라 어법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심리적 옆구리 찌르기의 달인일까? 상대방의 사정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무를 썰듯 손쉽게 상대방의 상황을 재단하려 들었다. 더욱이 이런 대화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어서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방하착 착득거’(放下着 着得去)라는 불가의 언어에서 나온 말이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나 집착, 원망 등을 벗어던지고 홀가분해져야 인생의 쇄신을 구할 수 있다는 깊은 메시지다. 비워야 새롭게 채울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오랜 진리다.
그런데 그는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았을까? 일반적으로 내려놓는다고 할 때 그 대상은 ‘무거운 것’을 의미한다. 자기 두 어깨에 짊어지기에 과도한 권력, 너무 큰 타이틀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거에 본인이 차지했던 갑의 위치와 위압적인 태도도 포함된다. 그는 평생 갑의 자리에서 살던 사람인데, 최근 그 자리에서 물러나니 스스로 위안 겸 ‘다 내려놓았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차선 급변경하는 그의 대화 태도로 미뤄볼 때 최소한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은 아직 버리지 못한 듯했다.
‘내려놓았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직위를 내려놓았으면 돈을 잡으려 했고, 돈을 내려놓았으면 명예를 탐했다. 마음을 비웠다고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 어떤 자리나 기회가 생기면 그 누구보다 기를 쓰고 싸우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 그것이 보통 인간의 모습이고 따라서 내려놓는다는 말을 함부로 남 앞에서 떠들 것은 아닌 듯싶다.
어찌되었든 귀가해서도 ‘살살하라’와 ‘내려놓고 비웠다’는 말은 귓전에 계속 남았다. 일단 내 작업실을 휘 둘러보았다. 한마디로 아수라장에 가까웠다. 매일 다른 주제의 글을 쓰고 강연 준비를 하느라 마치 책과 자료들이 레슬링 하는 것처럼 엉켜 있었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그 방의 주인인 나조차 알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일단 버려야 해. 책상 위건 책장이건 모두 꽉꽉 차서 도무지 들어갈 빈틈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창의력이 생기겠어? 비우고 또 비우자!”
이렇게 해서 폭염의 날씨에도 주말을 이용해 하루 종일 버리고 또 버렸다. 그러다 어느 수첩 사이에서 메모지 한 장이 툭 튀어나왔다. 커피 자국이 배어 있는 것을 보니 정확히 5년 전,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앞두고 사무실에서 두서없이 쓴 메모였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길을 잃었다. 쳇 베이커의 재즈 트럼펫과 다크 초콜릿 같은 쓸쓸한 목소리가 섞인 그의 앨범 <레츠 겟 로스트>(Let's get lost)를 들으며 이제 어디론가 떠나가야 한다. 오르막 인생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가르쳐주지만 내려가는 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사람은 오르면서 강해지고 내려가면서 현명해지는 법인가. 다시 원래의 배역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주연이 아닌 하찮은 배역이 맡겨진다 해도 절대로 투덜거릴 일은 아니다. 돌아보면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준비를 하였던 것은 아닐까. 이제 비우고 또 비울 일이다.”
여기도 비운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명함, 법인카드, 출입증,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변의 것들이 낯선 타자로 돌아서 있었다. 소유가 아니라 잠시 점유하다 갈 뿐이다. ‘적게 소유하고 사는’ 연습이 필요했다. 성인 가족 네 명이 모두 사회활동을 하지만 산 지 16년 되는 국산 자동차 한 대를 공용으로 쓰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다. 없으면 불안할 것 같았던 것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았다.
미켈란젤로는 조각이란 뭔가를 덧붙이는 작업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을 덜어내는 작업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글도 마찬가지다. 군더더기와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야 좋은 글이 나온다. 비우고 덜어내야 할 것은 물건만이 아니었다. 불필요한 약속, 의미 없는 모임을 줄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만남과 모임도 과소비 양상을 보인다. 정작 만나서 서로 딴청을 피우기 일쑤 아니던가. 일정표를 비우니 스스로 선택한 일정과 상대방에 더 집중하게 됐다.
미니멀리즘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인류의 많은 선조가 실천하며 살았다. 다만 지금 이 시기 나의 미니멀리즘은 조금 다르다. 무조건 소비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혹은 의무적인 소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가격이 아닌, 가치를 부여하는 삶이다. 내가 생각하는 미니멀리즘 정신이다.
행복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happiness’(해피니스)는 ‘happening’(해프닝)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던가. 느닷없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행복이 온다는 것이다. ‘살살하라’라는 말이 처음에는 불쾌했지만 그 해프닝 덕분에 미니멀리즘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었으니까, 다시 미니멀리즘이다.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손관승 CEO·언론인 출신의 라이프 코치ㅣ저서 『me, 베를린에서 나를 만났다』 등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