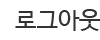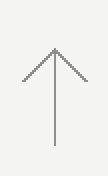-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서울시는 주민들이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사진은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문을 연 중랑구 책깨비 도서관 . 중랑구청 제공
사회철학으로 유명한 홍윤기(60·동국대 철학) 교수는 서울 시민참여예산학교(이하 참여예산학교)의 학생이다. 정확히는 ‘졸업생'이다. 지난 9일 참여예산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마쳐 수료증을 받았다. 사실 그는 이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강의하는 선생님이기도 하다. 서울시 민주시민 교육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 교수는 “가계부를 쓰고 보는 것처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예산을 읽어낼 수 있어야 민주시민이라고 말해 왔는데, 늦게나마 실행으로 옮겨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이 국가의 운영 체계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참여예산학교는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의 ‘배움터'다. 학교에서는 서울시 재정과 예산 현황, 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에 대한 강의가 이뤄진다. 보통 2주간 하는데, 올해엔 6·9·11월에 세 차례 예정돼 있다. 9월부터는 자치구 권역별로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한다. 학교를 수료한 회원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 후보가 되고 시의 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하는 투표권을 갖는다. 올해 참여예산위원은 3월 수료생 가운데 추첨으로 뽑은 200명, 지난해 위원으로 활동한 75명, 시장과 전문가가 추천한 25명 등 모두 300명이 선정된다. 시는 그동안 예산학교에 참여했던 모든 수료생의 인력은행을 만들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참여예산제도의 시민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달 20일 개편안을 발표했다. 참여예산학교를 상시 운영하기로 하고, 시민들이 참여예산제에 관여하는 방법도 개선했다. 시민이 참여예산제에 직접 관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이 되는 것과 예산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시민참여예산위원은 다른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분야별 민관협의회에서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과 함께 심사한다.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사업 타당성을 꼼꼼하게 살펴, 총회에 올릴 사업을 실제로 뽑는 것이다. 이때 제안자의 설명을 듣거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모은다.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도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의 가장 주요한 변화는 서울시 전체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 폭을 넓혔다는 점이다. 140~150여 명의 예산위원이 전문 분과에 참여해 4월부터 12월까지 시 전체 재정 분야를 살펴본다. 참여 분과는 서울시 전체 예산(온예산), 예산 낭비 감시, 모니터링, 결산, 재정 운영 등이다.
이원목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그동안 시민 참여는 500억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와 선정에만 머물렀는데, 올해부터 시 재정 전반으로 넓혔다”며 “시민이 예산의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올해 시민참여예산위원이 못 되었어도 참여할 기회는 더 있다.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9월 초에 열리는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이때 시민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투표로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예산위원(40%), 전체 시민(50%), 예산학교 회원(10%) 등이 투표를 해 각각의 비율만큼 사업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다.

지난 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2017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학교’가 열렸다. 홍윤기(동국대 철학과) 교수의 강의를 듣기 위해 8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조진섭 기자 bromide.js@gmail.com
시민 참여의 또 다른 축은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올해 시민참여예산의 규모는 지난해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었다. 기존 주민참여예산(500억원)에 시정분야 협치 예산(100억원), 지역분야 자치구 협치 예산(100억원) 등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예산들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시정분야 협치 예산 사업은 내년에 추진되며, 올해는 사업 제안·숙의·선정 과정을 거친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시민과 관련 부서가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내실화하고, 민관예산협의회의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시민들의 투표로 최종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다. 자치구와 동 단위에서 협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 참여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는 자치구에는 최대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자치구 단위 시민참여예산(5억원)과 통합해 추진하는 자치구에는 주민들과의 원활한 숙의와 공론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2억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마을계획 등 주민 숙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에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3000만원의 예산도 지급한다. 이현숙 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시정분야 협치 예산 사업은 내년에 추진되며, 올해는 사업 제안·숙의·선정 과정을 거친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시민과 관련 부서가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내실화하고, 민관예산협의회의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시민들의 투표로 최종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다. 자치구와 동 단위에서 협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 참여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는 자치구에는 최대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자치구 단위 시민참여예산(5억원)과 통합해 추진하는 자치구에는 주민들과의 원활한 숙의와 공론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2억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마을계획 등 주민 숙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에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3000만원의 예산도 지급한다. 이현숙 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